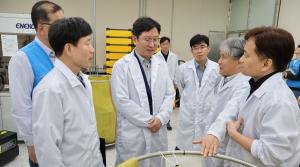내달1일 현대百 면세점 무역센터점 오픈
롯데 월드타워점·신세계 강남점과 ‘3파전’
시장경쟁 과열 과도한 송객수수료 우려도

면세업계가 올해 전체 매출 18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 보따리상(따이궁·代工)들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요 ‘빅3’ 업체들이 모이면서 경쟁이 한층 더 과열될 전망이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면세점 총 매출은 9조19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월 평균 매출은 1조5300억원 규모다.
업계 내에서 올 한 해 면세점 매출이 18조원은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인 14조4684억원 보다 30%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실적은 보따리상들의 활약 덕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면세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遊客)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올해 초만 해도 한중 관계의 해빙모드로 유커의 방문이 대폭 증가하고 면세점, 호텔, 화장품 등이 다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복 속도가 느려 업계의 애간장을 태웠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방한 단체관광 상품을 전면 허용하지 않는 등 사드 사태의 봉합 수순을 더디게 밟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산둥, 상하이, 장쑤성 지역 정도에서만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사드보복 이전까지는 일반 패키지 고객들이 와서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매출들은 대부분이 보따리상 매출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따리상들은 대부분 국내외 브랜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는 식이다"며 "대량구매인 만큼 할인율도 커 수익구조만 따져보았을 땐 일반단체 관광객만큼 좋지는 않으나 그만큼 방문객 수가 많다보니 매출의 대부분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 강남권 형성…경쟁 속도 붙을 전망
면세업계는 보따리상들로 쏠쏠한 재미를 누리고 있다. 최근 중국 공항의 세관검사 강화로 실적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실제 큰 영향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보따리상과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강남이다. 강남구에는 롯데월드타워점과 지난 7월 오픈한 신세계면세점강남점이 있다. 여기에 내달 1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무역센터점이 개장한다. 강북에 이어 강남에서 국내 면세 ‘빅3‘가 맞붙게 됐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3사가 한 지역구에 밀집돼 있으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상권이 형성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보통 단체 관광객이나 보따리상들은 쇼핑관광 시 2~3곳은 둘러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경우도 신라, 롯데, 신세계가 모여 있어 매출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생기면서 강남권 주요 면세점 3곳을 묶는 관광 코스도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고객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마케팅 비용)도 과열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보따리상들이 산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여행사에 돌려주는 것이다.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다. 한쪽 업체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사들도 줄줄이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신규 진입 업체 위주로 송객수수료가 올라가고 있어 과도한 경쟁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긴 하다”며 “마케팅 활동도 적당한 선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